너무 00한 것들과의 안녕
속초, 동해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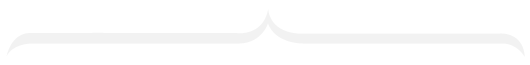
세상에 모든 것들에 그만의 심상을 가져다붙인다면
바다는 출렁여도 절대 넘치지 않음 이며,
그 중 동해바다는
무한한 찬란함이 아닐까 했다.
....
그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시원하며 찬란한 빛이
빛나지 않고, 푸르지 않고, 희미하기만 한 나의 존재성을
적나라게 비출까 두려워 멀리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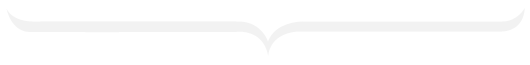
너무, 그리운 마음도
적당히 그리울 수 있다면
2023. 2. 5. 속초
난 너무 예쁜건 너무 예뻐서 어려웠어
그러니까 예쁜 것도 내게는 적당히의 미덕이 중요해
너무
많은 말과 생각, 고민과 걱정에
어깨가 무겁지 않기로
앞으로 다신 가질 수 없을 지 모르지만
너무 많이 좋아한게 아니라
적당히 좋았더라고
말할 수 있는 것들은
편안함과 함께할 수 있었어
너무
우울하지말고 조금만 우울하기로
너무 불안한 일도 그 순간에서 떼어놓으면
아무일도 아니야
그래서 이제는 괜찮아
너무 00한 동해이기 때문에
바다는 파도가 쳐야 바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.
바다이기 때문에 당연한 파도,
바다이기 때문에 당연한 파도,
나는 그 파도와도 같은 것들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 지도 모른다.
내가 어찌할 수 없이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며,
그로인한 나의 감정의 동요같은 것들.
또, 예측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.
삶은 고통이라고 말하며 평생을 고통에서의 해방을 연구했던,
하지만 늘 그 고통과 함께한 쇼펜하우어도 같았을까.
막연하게 상상하던 동해를 마주한 뒤, 가장먼저 든 생각은
역시 바다는 동해지 하는 속설에 대한 인정과 감탄이었다.
이렇게 예쁜 너라면 나를 휘젖고 적나라게 비추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.
온전히 나를 인정하고, 슬퍼하다 끝내는 위로를 받게된 이야기.
너무 찬란한 동해이기 때문에
너무 예쁜 너였기 때문에